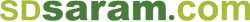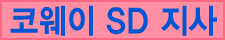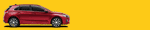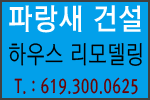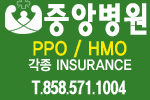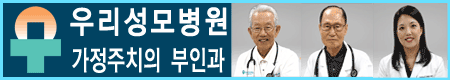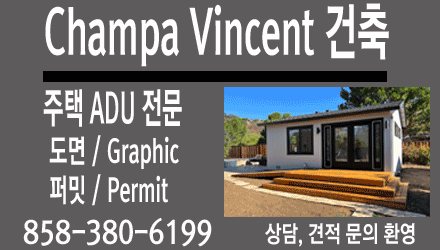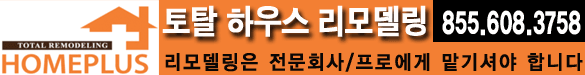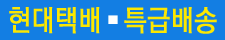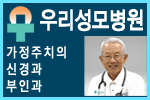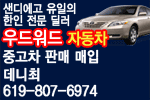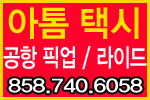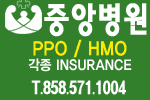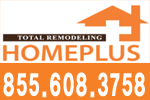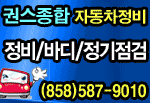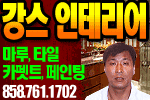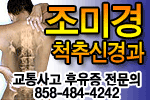(펌)나는 사랑의 힘을 믿는다
조지 타마린이라는 이스라엘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. 8~14세 이스라엘 어린이 1000명에게 ‘여호수아서’에 나오는 예리코 전투 장면을 읽어줬다. “여호수아가 외쳤다. 저 성과 그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해 (그리고 약탈해) 주께 바쳐라. (…) 그들은 남녀노소와 소·양·나귀 등 도시의 모든 것을 칼로 없애고 불태웠다.” 이어 문제를 낸다. “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옳은가.” 66%에게는 전적으로 옳았고 26%에게 전적으로 나빴다. 타마린은 다른 이스라엘 어린이 집단에 같은 질문을 했다. 이번엔 여호수아를 ‘린 장군’, 이스라엘을 ‘3000년 전 중국 왕조’로 바꿨다. 결과는 정반대였다. 린 장군에 찬성한 아이들은 7%에 불과했고 75%는 반대했다.
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신저 『만들어진 신』에서 종교가 인류의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이 예를 든다. 대량학살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용납되는 현실 말이다.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또 한번 타마린의 실험 대상이 된 느낌이다. 질문은 이렇다. “23명의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를 했다. 그들의 행동은 옳은가.” 그 물음은 이렇게 바뀐다. “23명의 한국 청년이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다. 그들의 행동은 옳은가.” 대답은 타마린의 결과만큼이나 극과 극일 터다. 처음 질문엔 비난이, 나중 질문엔 칭찬이 쏟아질 게 분명하다. 종교란 이름만으로 칭찬이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.
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. “23명의 기독교도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다. 그들의 행동은 옳은가.”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다. 기독교도의 봉사란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는 듯 봉사란 단어를 선교로 바꾸려 애쓰는 사람들이 딱해서 하는 얘기다. 인터넷을 뒤져 입맛에 맞는 사진과 동영상을 찾아내 증오를 퍼 나르면서도 주리고 병든 아이들을 먹이고 치료하는 모습들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가여워 하는 얘기다.
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라크·레바논 같은 이슬람 지역에 가 본 사람은 안다. 그곳에서의 선교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 말이다.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그럴지 몰라도 무슬림 앞에서 “주 예수를 믿으라”고 외칠 형편이 못 된다.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에 귀 기울이는 무슬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가족과 이웃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. 대신 그들이 하는 건 사랑을 베풀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. ‘세상 끝날까지 땅끝에 이르도록’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이행하려면 그 수밖에 없는 것이다. 흔히 선교와 봉사라는 단어가 혼용되는 이유다.
나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런 선교라는 이름의 봉사를 지지한다. 설령 그 뒤에 한국 교회들의 세력 확장 경쟁이 숨어 있더라도 그렇다. 종교·종파 갈등으로 싸움이 끊이지 않는 땅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알고 있어서다. 그들을 돕는 데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는 선교사들도 따라서 많음을 알고 있어서다.
팔레스타인 아이들의 대부로 통하는 강태윤(49) 목사가 그런 사람이다. 그는 18년 전 팔레스타인 민병대가 소총을 메고 활보하는 베들레헴에 교회 대신 ‘조이하우스(즐거운 집)’라는 유치원을 열었다. 그가 실천하려는 믿음, ‘공존의 싹’을 틔우기 위해서다. 5년 전 들었던 그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. “지금 노느라고 정신없는 저 아이들이 몇 년 후엔 아버지·삼촌 대신 소총을 잡습니다. 감정의 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해요.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.”
나는 그런 사랑의 힘을 믿는다. 그리고 지금은 철 없어 보여도 단기 선교가 또 하나의 강태윤을 만드는 씨앗이 되리라고 믿는다. 그러는 사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.
중앙일보 이훈범 논설위원
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신저 『만들어진 신』에서 종교가 인류의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이 예를 든다. 대량학살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용납되는 현실 말이다.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또 한번 타마린의 실험 대상이 된 느낌이다. 질문은 이렇다. “23명의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를 했다. 그들의 행동은 옳은가.” 그 물음은 이렇게 바뀐다. “23명의 한국 청년이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다. 그들의 행동은 옳은가.” 대답은 타마린의 결과만큼이나 극과 극일 터다. 처음 질문엔 비난이, 나중 질문엔 칭찬이 쏟아질 게 분명하다. 종교란 이름만으로 칭찬이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.
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. “23명의 기독교도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다. 그들의 행동은 옳은가.”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다. 기독교도의 봉사란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는 듯 봉사란 단어를 선교로 바꾸려 애쓰는 사람들이 딱해서 하는 얘기다. 인터넷을 뒤져 입맛에 맞는 사진과 동영상을 찾아내 증오를 퍼 나르면서도 주리고 병든 아이들을 먹이고 치료하는 모습들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가여워 하는 얘기다.
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라크·레바논 같은 이슬람 지역에 가 본 사람은 안다. 그곳에서의 선교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 말이다.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그럴지 몰라도 무슬림 앞에서 “주 예수를 믿으라”고 외칠 형편이 못 된다.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에 귀 기울이는 무슬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가족과 이웃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. 대신 그들이 하는 건 사랑을 베풀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. ‘세상 끝날까지 땅끝에 이르도록’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이행하려면 그 수밖에 없는 것이다. 흔히 선교와 봉사라는 단어가 혼용되는 이유다.
나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런 선교라는 이름의 봉사를 지지한다. 설령 그 뒤에 한국 교회들의 세력 확장 경쟁이 숨어 있더라도 그렇다. 종교·종파 갈등으로 싸움이 끊이지 않는 땅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알고 있어서다. 그들을 돕는 데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는 선교사들도 따라서 많음을 알고 있어서다.
팔레스타인 아이들의 대부로 통하는 강태윤(49) 목사가 그런 사람이다. 그는 18년 전 팔레스타인 민병대가 소총을 메고 활보하는 베들레헴에 교회 대신 ‘조이하우스(즐거운 집)’라는 유치원을 열었다. 그가 실천하려는 믿음, ‘공존의 싹’을 틔우기 위해서다. 5년 전 들었던 그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. “지금 노느라고 정신없는 저 아이들이 몇 년 후엔 아버지·삼촌 대신 소총을 잡습니다. 감정의 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해요.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.”
나는 그런 사랑의 힘을 믿는다. 그리고 지금은 철 없어 보여도 단기 선교가 또 하나의 강태윤을 만드는 씨앗이 되리라고 믿는다. 그러는 사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.
중앙일보 이훈범 논설위원